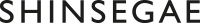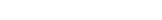매거진
‘첫’이 들어가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인생 첫걸음, 시작의 의미
“그때 어린 요하네스가 길게 뻗었던 다리를 배 쪽으로 웅크리며 울기 시작한다, 세상에 저 조그만 핏덩이 안에 저런 힘이 있다니, 믿을 수 없군, 저 조그만 녀석이 저런 목청을 가지고 있다니, 올라이는 생각한다, 이런 세상에 세상에.”
202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욘 포세의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이 작품은 요하네스라는 한 평범한 어부의 일생을 탄생에서 죽음까지 보여준다. 삶이란 쉼은 있어도 멈춤은 없다는 듯 마침표 없이 거의 쉼표로만 이어지는 문체가 특징이다.
올라이가 아들 요하네스의 탄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장면, 즉 요하네스가 “자신의 근원인 어머니 몸에서 나와 저 밖의 험한 세상에서 제 삶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출발해 첫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요하네스의 인생 첫 아침이 끝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인생 첫걸음, 그 시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묻는다.
인생은 무無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무상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란 목숨 걸고 힘겹게 태어나 단독자로서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살다가 “스러져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 물고기, 집, 그릇,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무에서 무로” 이행하는 일이 인생이란 것이다. 요하네스가 세상에 나오려고 애쓰는 도중, 올라이는 안쓰러운 마음에 잠시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어머니 자궁의 양수에서 헤엄치던 시절을 낙원으로 보고, 탄생을 일종의 상실, 불안과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오욕으로 여기는 허무주의적 사유는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삶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불과하고, 인간의 진짜 삶은 죽음 너머에서 시작된다. 프로이트는 말했다. “행복은 선사시대에 간절했던 소망이 나중에 충족되는 것이다.” 인생의 진실한 기쁨은 선사시대, 즉 탄생 이전 자궁 시절에 있고, 삶이 모두 끝난 나중에야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탄생을 저주로 만들고, 시작을 허무로 몰아간다.
탄생 이전과 죽음 너머 사이에 걸쳐진 삶,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생생한 삶을 프로이트는 불안에 감염된 신경증 환자로서 살아간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 라틴어로 안구스티아angustia, 즉 좁은 산도産道를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억눌린 상태로 태어난다. 안구스티아는 고뇌, 불안,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인간의 첫출발, 삶의 첫 경험을 고통으로 보는 셈이다. 프로이트가 태어남을 “똥과 오줌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다. 인간은 고통에 오염된 채 태어나 불안을 견디다 불행 속에서 죽음에 이른다. 슬픈 인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자기가 유령 같은 허깨비가 아니라는 듯, 요하네스는 목청 높여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린다. “울음소리는 아이가 새로이 속한, 세상을 가득 메운다.” “자신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메우려는 듯한, 무엇인가”를 세상에 쏟아낸다. 이것이 포세가 생각하는 ‘처음’ 이다. 무에서 무로 이어지는 듯 보이는 허무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삶은 생성이고 창조이며 풍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태초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나니.” 히브리 사람들에 따르면 신은 마지막에 인간을 빚어서 세상에 있게 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 즉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나가라.”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낳고 번성하는 일, 즉 생성이고, 창조이며, 풍요다.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요하네스의 첫울음을 통해 포세는 인생이란 자신의 움직임, 행위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임을 알려준다. 과연 요하네스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일곱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를 늘렸다.
인간의 삶이란 헛되고 공허한 것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다. “건조하고 두려운 고요” 속에 “그것만이 아닌 것, 그 이상의 많은 것”이 존재한다. “푸른 하늘”이, “이파리를 틔워내는 나물들”이, 즉 “인간에게 심오한 것들과 피상적인 것들을 이해할 단서를 마련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모든 것에 내재해 무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의미와 색을 부여하는”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아침 그리고 저녁>은 요하네스가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아버지 올라이처럼 요하네스도 평생 어부로 살면서 페테르와 친구가 되고, 에르나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었다. 요하네스가 할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요하네스가 되었듯, 그중 한 아이는 할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올라이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름을 이어받고 이어주면서 무한히 반복해서 삶을 다시 시작한다.
인생의 아침과 저녁 사이에 우리는 첫울음을 울고, 첫발을 떼고, 첫걸음을 걷고, 첫사랑을 하고, 첫출발을 하고, 첫아이를 낳는 등 무수하게 ‘처음’을 겪으며 살아간다. 삶이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평생 수줍고 서툰 아마추어처럼 호기심을 품고 신기함을 느끼면서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인생은 장기 두면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다. 장기판에서 아이가 수를 놓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듯, 삶 역시 매 순간 다시 시작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젖힐 수 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는 모두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그것은 시도이면서 결과이고, 연습이면서 실전이다.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기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순수하고 신선하며, 경이롭고 거룩하다.
붙박이 현실을 움직이는 가능성으로
아이처럼 산다는 것, 인생을 매 순간 처음 대하듯 산다는 것은 오직 현재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야기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구르기 시작하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 설령 과거에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버렸으니 더는 손쓸 수 없고, 앞날의 비참과 허무가 걱정되더라도 아직 오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순진무구한 삶이란 어제에 매이거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처음 대하듯 오늘을 시작하는 일이다. 스스로 구르기 시작하는 바퀴처럼 삶을 순간순간 긍정하면서, 즉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조하면서 사는 것이다.
<삶의 기술 사전>에서 안드레아스 브레너 스위스 바젤대학교 교수는 니체의 어린아이가 시간의 영토를 새롭게 일구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참되고 좋으며 아름다운 새 우주를 창조한다. 아기와 더불어 세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시작한다는 것은 곧 아이처럼 되는 일이다. 붙박이 현실을 움직이는 가능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어제를 오늘로 혁신하는 일이다. 나날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일이다.
심지어 죽음조차 삶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 요하네스에게 죽음은 낯설고 이상한 일로 다가오지만, 쉼표처럼 잠깐 멈추었다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절친 페테르가 요하네스를 마중 나와서 안내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은 “거대하고 고요하고 잔잔히 떨리며 빛이 나고, 환하기도” 한 곳으로 이어진다. 페테르는 속삭인다.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죽음은 사랑의 종말, 무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확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과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는 일이다.
‘아직 아님’을 바라보면서
‘첫’이 들어가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한다. 첫길, 첫날, 첫마디, 첫머리, 첫새벽, 첫선, 첫인사, 첫인상, 첫입, 첫잠, 첫정, 첫차, 첫해 등. ‘첫’은 멈춘 듯한 삶을 가능태로 바꾸고, 무한한 자유 속으로 풀어놓기 때문이다. ‘첫’은 공허에 붙잡힌 삶이라는 허무주의를 버리고, “그것만이 아닌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상상하며, 이를 씨 뿌려 시간의 영토에서 싹 틔우는 일이다. 요하네스의 평범한 삶은 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희망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이미 있음’을 ‘아직 아님’ 으로 전환할 때 희망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희망하는 일이다. ‘아직 아님’을 바라보면서 무 이상의 것을 이룩하기 위해 오늘을 처음 대하듯이 삶의 첫발을 떼는 일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움직임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
writerJang Eunsu 출판 편집인·문학평론가
editorJo Sohee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