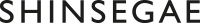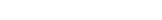매거진
냉면 예찬
반죽을 눌러 제면기로 뽑아낸 압출면처럼, 냉면 한 그릇에 농축된 미식의 기록.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면스플레인’을 펼치는 이들의 이야기는 서울식 미각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17세기 자줏빛 육수 냉면
국수를 뽑는 방법은 다양하다. 밀가루로 만드는 면은 길게 늘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수타 짜장면을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메밀, 감자가루, 녹두전분 같은 잡곡분을 써서 국수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당겨 늘여서는 불가능하다. 글루텐 함량이 낮거나 글루텐이 아예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죽을 평평하게 펴서 칼로 자르거나 국수틀에 넣고 눌러 뽑아야 국수를 만들 수 있다. 냉면은 이런 압출면의 대표 격이다. 누가, 언제부터 냉면을 먹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냉면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 조선 후기 문신 장유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펴낸 <계곡집>에는 ‘자장냉면’이라는 시가 나온다. 자줏빛 육수가 노을처럼 영롱하고 옥색 가루가 눈꽃처럼 흩뿌려진 모습의 냉면이다. 조선 시대 냉면 육수에 동치미 국물, 콩물, 깻물, 오미자 국물 등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자줏빛이 도는 국물은 오미자 국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장냉면 육수 재료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겨울에 먹던 국수, 냉면
지금은 여름철 별미로 굳었지만 한반도에서 원래 냉면은 겨울에 먹는 국수였다. 그 시작이 겨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 차가운 국물을 만들 때 필요한 얼음이나 동치미 국물이 겨울에나 구할 수 있는 식재료였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얼음 보관과 제빙 기술이 발달하자 여름에도 냉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17년 방신영이 쓴 <조선요리제법>은 여름냉면과 겨울냉면을 구분해 설명한다. 가게에서 파는 여름냉면은 고깃국이나 닭국을 식혀 국수를 말고 한가운데 얼음 한 덩이를 넣는 것이고, 집에서 만든 여름냉면은 장국이나 깻국, 콩국에 국수를 말고 얼음을 넣어 먹는 방식이다. 우리가 아는 냉면 형태에 가까운 건 역시 겨울냉면이다. 겨울냉면은 국수에 동치미 국물을 부어 만들었다. 냉면이 겨울 음식이었던 것은 메밀과도 관련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국수를 만드는 메밀의 수확 시기가 늦가을이었다. 메밀은 2개월이면 성큼 자라 수확할 수 있지만 여름에 거두면 저장이 만만치 않다. 메밀에는 대부분의 곡물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지질이 들어 있어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저온에서 저장할 수 있는 겨울에야 그나마 장기 보관이 가능했다. 겨울이 수확 적기이므로 여름에 씨를 뿌려 늦가을에 거두는 게 시기상 적절하다.
냉면이 겨울 별미로 여겨진 것은 추운 겨울날 따끈한 온돌방에 앉아 맛보는 차가운 국수의 운치 때문이기도 하다. 1929년 12월 <별건곤>이란 잡지에 실린 칼럼니스트 김소저의 냉면 예찬을 보자. “살얼음이 뜬 진장김칫국에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풀어 먹고 우르르 떨려서 온돌방 아랫목으로 가는 맛! 평양냉면의 이 맛을 못 본 이요! 상상이 어떻소?” 바깥은 추운데 펄펄 끓는 온돌방에 앉아 쩡한 동치미 국물에 만 국수를 맛보는 재미란. 이런 역설적 즐거움은 1941년 <문장>지 종간호에 실린 백석의 시 ‘국수’로 이어져, 다시 1973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로 이어진다. “밤 깊도록 윷놀이를 하다가는 밤참으로 얼음 동치미에 막국수를 말아 꿩고기 꾸미를 얹어 먹지. 그 맛이란 참! 이불을 목에까지 뒤집어쓰고 훌훌 소리 내며 먹으면 위에선 이가 시려 덜덜 떨리고 아랫도리는 방바닥이 뜨거워서 후끈후끈 달고….”
한반도 지역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
세대와 계절의 제한 없이 사랑받아온 냉면은 유래 지역에 따라 다채로운 맛을 낸다. 먼저 해주냉면은 황해도 해주의 냉면을 재해석한 것으로 백령도, 옥천 등에서 맛볼 수 있다. 청양고추와 고추씨 등을 활용해 매운맛을 낸다. 지리산 인근 메밀로 만드는 진주냉면도 독특하다. 한편으론 바다에 인접한 곳인 만큼 육수에 바지락, 마른 홍합, 마른 명태 등 다양한 해산물이 등장한다. 더불어 제사 음식인 소고기 육전을 고명으로 올린다. 진주냉면에서 유독 진한 육향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이유다.
냉면은 메밀가루로 만든 면발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점성이 부족해 반죽을 누르는 압출식 제면기로 면을 뽑아낸다. 제면기에서 나온 면은 뜨거운 물에 2~3분만 익힌다.
스피드가 곧 면의 탄력, 막국수
요즘에는 막국수를 강원도 음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막국수는 냉면과 같은 음식이다. 막국수라는 이름의 유래는 막과자, 막소주처럼 거친 음식이라는 설과 메밀을 막 갈아 만든 국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둘 다 일리 있다. 껍질을 덜 깎은 겉메밀을 섞어 갈아 만든 메밀국수의 식감은 ‘막’이라는 접두어의 뜻처럼 거칠다. 메밀국수는 제분하자마자 ‘막’국수로 삶아내야 한다. 제분할 때 거무스름한 겉껍질이 어느 정도 남느냐에 따라 국수의 색깔과 풍미, 식감이 달라진다. 100% 속 메밀로 만든 막국수는 평양냉면과 마찬가지로 연한 회색이다. 메밀 속 지질은 분해되기 쉽고, 휘발성 풍미 물질은 열을 가하면 날아가버릴 수 있다. 자칫 제분기가 과열되기라도 하면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미는 사라지고 만다. 햇메밀이나 저온에서 보관한 통메밀을 갓 빻아 반죽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반죽도 바로 사용해야 한다. 치댈수록 글루텐이 엉기며 쫄깃해지는 밀가루 반죽과 달리 메밀에는 글루텐이 없다. 메밀 속 80%를 차지하는 전분, 14%의 단백질과 약간의 점액질이 반죽을 결합시키긴 하지만 불안정하다.
면의 조직감을 살리는 비결
풍미와 조직감을 좋게 하려면 반죽을 하자마자 즉시 국수틀에 넣어 면을 뽑아야 한다. 제면기로 뽑은 면은 곧바로 펄펄 끓는 물에 익힌다. 메밀국수는 2~3분 만에 익는다. 타이밍을 놓치면 금방 퍼져버린다. 얼른 꺼내 차가운 물에 씻어 지나치게 익는 것을 막고 겉면의 전분을 씻어내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찬물에서 급속히 온도를 낮춰 전분의 호화를 중단시키므로 쫄깃하고 탄력 있으며 독특한 식감의 국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든 면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식감이 달라진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을 때는 부드럽고, 차가운 국물에 말아 먹으면 더 단단하면서 탄력이 느껴진다. 메밀의 결합력을 보완하기 위해 넣는 전분 또는 밀가루의 함량에 따라서도 면의 조직감이 달라진다.
사시사철,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서울에서 ‘함흥냉면’이라 불리는 음식은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을 넣어 쫄깃하고 가늘게 뽑은 면을 비벼 먹는 것을 말한다. 냉장·냉동 기술이 발달해 이제 냉면은 사시사철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1931년 제 41호 <별건곤>에는 또 한번 냉면을 예찬한다. 1929년 발행한 24호에서 봄과 가을을 각각 “가득 담은 한 그릇의 냉면”을 즐길 제철, 오랜 동무와 냉면을 먹기 좋은 제철로 소개한 이후다.
“평안도 같은 데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냉면이 더 맛있고 운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서울에서는 여름철에 냉면을 많이 먹는다. 아니, 평안도에서도 실제 많이 먹기는 여름이다. 그것이야 어찌 되었든 여름철에 눌러 먹고사는 사람이야 냉면집밖에 또 무엇이 있으랴. 서울에도 지금은 냉면집이 해마다 늘어간다. 값으로 치면 어느 집이나 보통 15전이지만 솜씨에 따라 맛이 각각이다.”
특히 메밀국수에 동치미 국물, 고기 국물 또는 이 둘을 혼합한 찬 국물을 부어 먹는 평양냉면은 한반도 미식의 표준 음식이라 할 만하다. 꿩 삶은 국물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소·돼지·닭을 어떤 비율로 넣어서 만든 육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슴슴한 국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가, 식전 마시는 면수에서 메밀 향을 느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메밀면은 입안에서 뚝뚝 끊기지만 미식가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아 ‘면스플레인’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다. 함흥냉면은 함경도에서 즐겨 먹던 농마국수에서 유래했다. ‘농마’는 녹말을 뜻하는 말로 국수 재료가 감자 전분, 즉 녹말임을 알려준다. 전분으로 만든 면은 메밀가루로 만든 평양냉면보다 쫄깃하고 잘 끊기지 않아 가위로 잘라 먹어야 할 정도다. 이렇게 쫄깃한 면을 매운 양념과 가자미회에 비벼 먹는다. 그러다 실향민이 피란길에 오르면서 지역별로 재료가 다양해졌다. 고구마 전분을 쓰는 곳도 있고 가자미회 대신 명태, 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식 미각의 압축
진주냉면은 메밀가루로 만든 면을 쓴다는 점에서 평양냉면과 비슷하지만 육수가 다르다. 마른 명태 머리, 건새우, 건홍합 등의 해물을 넣어 국물을 낸다. 고명으로는 잘게 자른 소고기전을 올린다. 달걀물을 입혀 부친 육전에 면과 국물을 곁들여 먹으면 진주냉면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해주냉면은 함흥냉면과 달리 물냉면이 기본이다. 메밀에 전분을 섞어 좀 더 굵게 뽑은 면에 간장과 설탕을 넣고 주로 돼지고기를 베이스로 한 국물을 붓는다. 진하고 단맛이 나는 국물에 면은 더 굵고 거친 느낌이라 대비되는 맛이 있다. 여기에 돼지고기 완자를 얹기도 한다. 현대 평양의 평양냉면보다 원형에 가까운 것은 서울의 평양냉면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수의 질긴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메밀가루에 녹말가루를 넣어 매끈하고 질깃하게 뽑은 면에 간장 육수를 탄 평양의 냉면보다 100% 순면에 소금으로 간한 서울의 냉면이 진짜라는 것이다. 음식 문헌 연구가 고영이 1936년 6월 4일자 <조선중앙일보>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평양냉면이 서울로 올라오며 “담백한 맛은 없어지고”, “간장국이 짭짤히 엉긴” 서울식 미각으로 변했다는 설명이 등장한다. 결국 냉면 한 그릇을 비우는 것은 한식의 역사를 생생히 느끼는 방식인 셈이다.
전국 냉면 맛집
냉면 맛집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지금, 육수와 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는 ‘진짜’ 냉면 맛집을 찾아서.
※ 아래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제공 메뉴와는 다릅니다.
제주산 순메밀 100%의 평양냉면
서관면옥
면수 대신 메밀물이 나오는 순간, 순면을 고집하는 맛집의 오라가 서서히 느껴진다. ‘서관면옥식 평양냉면’의 별미는 메밀면의 곡향과 육수의 육향이 이루는 조화에서 비롯된다. 국물은 국내산 한우 양지와 사태 삶은 물을 베이스로, 지리산 흑돼지와 제주 토종닭 삶은 국물을 조합해 진한 육수를 낸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1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문의 02-521-9945
70여 년 전통과 맛을 계승한 막국수
철원막국수
철원에서 손꼽히는 메밀막국수집. SNS의 어떤 리뷰보다 현지인 맛집으로 인정받는데, 이곳을 방문한 다수가 입을 모아 극찬하는 메뉴는 비빔메밀막국수. 한번 맛보면 껍질째 갈아 만든 투박한 메밀면의 식감을 잊지 못한다. 통메밀과 속 메밀을 반반 섞어 특유의 향을 내고 직접 담근 무짠지로 깔끔한 맛을 완성한다.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58번길 13
영업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문의 033-452-2589
감자만두와 함께 즐기는 밀면
신가야밀면
부산 밀면 하면 떠오르는 3대 맛집 중 한 곳으로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50년 전통의 부산 향토 음식 밀면 전문점답게 시원한 육수, 밀가루와 전분으로 반죽한 쫄깃한 면발을 자랑한다. 감자 전분으로 만든 감자만두와 함께 먹을 것을 추천한다.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92번길 12
영업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30분
매주 수요일 휴무
문의 051-891-2483
하루 단 2백 그릇만!
서령
서령은 짧고 굵게 영업한다. 하루 단 2백 그릇, 강화섬 한우 암소로 낸 육수와 순메밀 100% 순면을 사용해 직접 제면한 순메밀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된다. 평양물냉면, 메밀온면, 평양비빔냉면, 들기름메밀국수를 각 1만원대에 즐길 수 있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보리고개로 96
영업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032-937-8774
북한 고려호텔 출신 셰프의 고려물냉면
설눈
1977년부터 북한에서 운영한 평양냉면 전문점 ‘설눈’이 4년 전 서초동에 문을 열었다. 고려물냉면의 경우 메밀 껍질을 함께 갈아 만든 면이 고소함을 배가한다. 흥미로운 것은 국물에 동동 띄운 잣. 깊은 육수에 계피 향으로 상쾌함을 더해 흥미로운 맛을 선사한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0-7 1층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매주 토요일 휴무
문의 02-6959-9339
대전 최초의 냉면집
대들보함흥면옥
알싸하고 매콤한 회무침을 고명으로 올린 대들보함흥면옥의 함흥식 비빔냉면을 맛본 이들이라면 함흥냉면의 별미 기준을 새로이 하게 된다. 고구마 전분을 익반죽한 뒤 숙성을 거치고 평양식 메밀을 섞어서 만드는 방식은 3대째 이어온 이 집만의 비법이다.
주소 대전시 중구 계백로1583번길 39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30분
문의 042-522-5900
writerJeong Jaehoon 푸드 칼럼니스트
editor Kim Minhyung